1. 기침이 전혀 나지않는 감기에 걸린 것 같다. 그냥 몸살이라고 부르면 되겠지만 왠지 감기를 앞에다가 붙여야만 할꺼같은 이유는 그냥 몸살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혹은 임상적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기침이 전혀나지않는 감기에 대처하는 내 방법은 단지 푹 쉬고 자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낮에 잠을 마니 잔 나는 새벽에 전혀 잠을 자지못하게 되었고 이렇게 야심한 밤에 뻘잡담이나 날리고 있게 된것이다.
2. 그런 고로 해야할 잡담들을 몇가지 더 해보아야겠다. 영화에 대한 리뷰는 확실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김이 샌다. '마더'를 본지 대충 2주가 가까이 지나가는거 같은데 정확히 기억하는 단 하나의 사실은 개봉 다음날 보았다라는 사실과 그날 영화를 보고난 후 먹은 저녁 아니 새벽 메뉴였다. 사실 이게 떠오른건 푹 자고 난후 어느새 '그녀석'을 호출해내서 같이 저녁을 먹을 때의 상황때문이다. 영화를 내가 누구랑 봤지라고 정확하게 영화를 같이 본 그녀석한테 떠들어되었고 그녀석은 역시 넌 지금 정상이 아닌거 같다라고 말해주었다. 사실 그말 외에 몇 마디 말들을 더했지만 기억나지가 않는다. 여전히 기침이 나지않는 감기는 진행형인거 같다. 아 추가로 기침이 전혀 나지않는 기억력감퇴를 유발하는 감기라고 불러야 겠다.
3. 어쨌든 내가 사랑해 마지않는 녀석과 밥을 먹고 수다를 떨다 녀석이 나에게 보라고 권해준 책은 '3월의 라이언'이었다. "그녀석은 역시나 내취향을 잘 안단말이야."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퀭훼진 눈을 비비면서 책을 건내준 녀석은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라고 받아논 '이제동 대 김택용'의 경기에 빠져들었다. "짜식 고마워 눈물이 나네." 나에게 그녀석은 언제나 흑기사같은 존재이다. 물론 그녀석은 나를 전혀 이성으로 보지않는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럴만도 하지만.
4.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상투적인 말투로 "밥은 먹었니."라고 물어봤고 또 옆에서 아빠는 또 그녀석의 집에 갔었니라고 묻는다. 난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난 맨날 그녀석에 밥을 얻어먹는게 미안하지도 않니라고 아빠는 내게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여지까지 꾹꾹 숨겨왔던 본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푸념섞인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할말이 없어진 나는 조용히 내 방안으로 들어와 차갑게 식어 있는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른다. 난 도망치는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할지 스스로 확신은 서지 않는다.
5. 세상엔 참 쉽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온라인에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블랙리스트라는 딱지가 붙게 된다. 근데 재밌는 사실하나를 더하자면 글빨이 있는 사람들중에도 소위 저런 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난 그런자들을 경멸한다. 물론 저런 사람들이 글빨이 있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글빨에 경도된 수많은 몽매한 인간들에 의해 저런 글을 쓰는 인간이 '소위 말하는 파워 블로거' 라는 행세를 하는 꼴을 보면 무지하게 경멸감이 치솟아 오른다. 사실 무식한건 가르친다고 해결될일은 아니라는건 세상을 오래살다보면 알게되는 어찌할 수 없는 비극중의 하나이다.
6. 4%의 취향.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가 집단에 속해지지않음 불안함을 느끼나보다. 재미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드라마가 4%라는 시청률을 보이니깐 돌변하더라. 왜그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4%의 취향이라는게 그리 싫은가. 사실 나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대는 것에 익숙한건 아니다. 뭐 난 20세부터 이미 마이너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견딜만하다라는 것 정도랄까. 하지만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평범하게 살았으면 내 쓰잘데없는 재능도 어딘가 쓸모있는데가 있지 않았을까?" 아는 후배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결코 생각난 말은 아니지만 가끔은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하는 삶을 꿈꿔보지만 지금의 나에겐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
7. 너무 길었다. 이 글을 쓰기전엔 분명 잠도 오지않았고 정신도 말똥했는데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지금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순간엔 조금씩 피로가 밀려온다. 그래서 더 길게 쓰는건 무리인거 같아 이만 끝내야 겠다.
"굿바이. 잡담끝."
Ps. 요즘 유난히 제목도 그렇고 굿바이 라는 말을 많이 쓴다. 사실 이제 이거도 식상하다.
설명: 마더-봉준호 연출의 4번째 장편영화.
3월의 라이언-허니와 클로버의 작가 우미노 치카의 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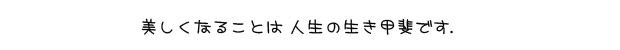
 rss
rss